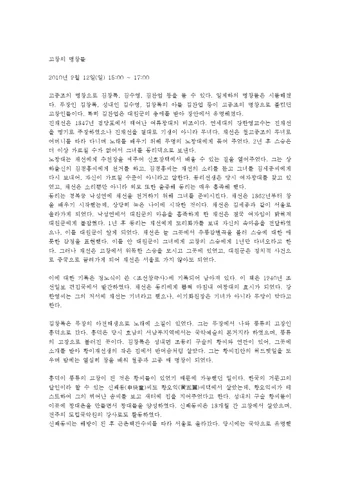고창의 명창들 2010년 9월 12일(일) 15:00 ~ 17:00 고종조의 명창으로 김창록, 김수영, 김찬업 등을 들 수 있다. 일제하의 명창들은 시들해졌 다. 무장인 김창록, 성내인 김수영, 김창록의 아들 김찬업 등이 고종조의 명창으로 불렀던 고창인들이다. 특히 김찬업은 대원군의 총애를 받아 장안에서 유명해졌다. 진채선은 1847년 검당포에서 태어난 여류광대의 비조이다. 연세대의 강한영교수는 진채선 을 명기로 주장하였으나 진채선을 절대로 기생이 아니라 무녀다. 채선은 철고종조의 무녀로 어머니를 따라 다니며 노래를 배우기 위해 무명의 노광대에게 묶어 주었다. 2년 후 스승은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어서 그녀를 동리댁으로 보낸다. 노광대는 채선에게 추천장을 써주어 신호장택에서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는 상 하출신의 김경홍씨에게 천거를 하고, 김경홍씨는 채선의 소리를 듣고 그녀를 김세종씨에게 다시 보내어, 자신이 가르칠 수준이 아니라고 말한다. 동리선생은 당시 여자광대를 찾고 있 었고, 채선은 소리뿐만 아니라 외모 또한 출중해 동리는 매우 흡족해 했다. 동리는 경복궁 낙성연에 채선을 천거하기 위해 그녀를 준비시킨다. 채선은 1862년부터 창 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상당히 늦은 나이에 시작한 것이다. 채선은 김세종과 같이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다. 낙성연에서 대원군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채선은 결국 여자임이 밝혀져 대원군에게 붙잡혔다. 1년 후 동리는 채선에게 도리화가를 보내 자신의 속마음을 전달하였 으나, 이를 대원군이 알게 되었다. 채선은 늘 그곳에서 추풍감별곡을 불러 스승에 대한 애 틋한 감정을 표현했다. 이를 안 대원군이 그녀에게 고창의 스승에게 1년만 다녀오라고 한 다. 그러나 채선은 고창에서 위독한 스승을 모시고 그곳에 있었고, 대원군은 정치적 사건으 로 중국으로 끌려가게 되어 채선은 서울로 가지 않아도 되었다. 이에 대한 기록은 정노식이 쓴 <조선창극사>에 기록되어 남아져 있다. 이 책은 1940년 조 선일보 편집국에서 발간하였다. 채선은 동리에게 뽑혀 마침내 여광대의 효시가 되었다. 강 한영씨는 그의 저서에 채선는 기녀라고 했으나, 이기화원장은 기녀가 아니라 무당이 맞다고 한다. 김창록은 무장의 아전태생으로 노래에 소질이 있었다. 그는 무장에서 나와 풍류의 고장인 흥덕으로 갔다. 흥덕은 당시 호남의 서남부지역에서는 국악예술의 본거지라 하였으며, 풍류 의 고장으로 불러진 곳이다. 김창록은 성내면 조동리 구술의 황씨와 연관이 있어, 그곳에 소개를 받아 황이재선생의 작은 집에서 반머슴처럼 살았다. 그는 황씨집안의 허드렛일을 도 우며 밤에는 열심히 창을 배워 철종과 고종 때 명창이 되었다. 흥덕이 풍류의 고창이 된 것은 황씨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한국의 거문고의 달인이라 할 수 있는 신쾌동(申快童)씨도 황오익(黃五翼)씨댁에서 살았는데, 황오익씨가 테 스트하여 그의 뛰어난 솜씨를 보고 새터에 집을 지어주었다고 한다. 성내의 구술 황씨들이 이곳에 광대촌을 만들면서 광대들을 양성하였다. 신쾌동씨은 18개월 간 고창에서 살았으며, 전주의 도립국악원의 강사로도 활동하였다. 신쾌동씨는 해방이 된 후 근촌백관수씨를 따라 서울로 올라갔다. 당시에는 국악으로 유명했
던 사람들이 황오익씨댁에 많이 있었다. 신쾌동은 1910년에 태어나 1978년에 사망하였다. 그는 거문고산조(散調)의 대가로, 원명은 신복동(申卜童), 호는 금헌(琴軒), 전라북도 익산 출신이었다. 9세 때에 박생순(朴生順)에게 양금(洋琴)을, 12세 때에는 박학순(朴學順)에게 가야금(정악·산조)을 배웠고, 13세 때에 정일동(鄭一東)에게 거문고로 민간풍류를 배웠다. 16세 되던 해에 거문고산조의 창시자인 백낙준(白樂俊)문하에 입문하여 산조를 처음으로 배 웠다. 백낙준가락을 이수한 후 고향인 익산에서 고창으로 거처를 옮겨 산조음악에 전념하고 있을 때, 당시의 명창 임방울(林芳蔚)·이화중선(李花仲仙)·이중선(李仲仙)의 권유로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 소재의 줄포가설무대에서 처음으로 거문고산조를 연주하였다. 그 뒤 목포의 목포극장에서 명창 이동백(李東伯)·정정렬(丁貞烈)·박녹주(朴綠珠)와 공연하였고, 1933년 5 월 10일에 후진양성과 창극운동의 전개를 목적으로 창립된 조선성악연구회에 가입하여 많 은 연주활동을 하였다. 그가 활동한 무대는 서울의 부민관(府民館)·단성사(團成社)·동양극장· 조선극장, 평안북도 평양의 금천대좌(金千代座), 함경남도의 함흥극장 등이었다. 그의 문하에서 배출된 제자로는 황오익(黃伍翼)·강성재(姜成在)·김병두(金兵斗)·양기평(梁基 平)·조위민(曺偉敏)·김기환(金基煥)·김영제(金泳帝)·윤경순(尹京順)·정옥자(鄭玉子)·구윤국(具潤 國)·김무길(金武吉)·성기군(成基君)·이창홍(李昌弘)·이세환(李世煥)·김효순(金孝順)·김영욱(金永 旭) 등을 들 수 있다. 거문고산조를 융성하게 한 공이 크며 1967년 7월 16일 중요무형문화 재 제16호 거문고산조 예능보유자(1967.7.16.∼1977.11.29.)로 지정받았다. 거문고산조의 음반이 남아 있다. [참고문헌] 重要無形文化財調查報告書 26―거문고散調―(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967) 이기화원장이 한 번 이곳을 갔는데, 황씨댁의 선반에 먼지가 하얗게 쌓인 뭔가를 보니 그것 이 바로 <현학금보(玄鶴琴譜)>였다. 바로 이 귀한 현학금보가 황씨댁에 있었던 것이다. 그 러나 그 후손들이 이 책을 남원문화원에 줌으로써 지금은 고창에 없고 남원문화원에 있게 된 동기가 되었다. 이 책을 이기화원장이 동아일보에 소개를 하게 되어 1964-5년에 나왔다 고 한다. 당시 황씨댁에는 이재선생이 쓰시던 거문고가 있었는데, 제주도의 목판으로 만든 것이었다. 거문고의 뒷 판에는 이재선생이 초서로 쓴 명싯구가 있었다. 황화익(黃和翼)씨은 흥덕의 양조장을 운영하여 부자가 된 사람이다. 그는 이기화원장의 외 숙이었기 때문에 당시 흥덕의 풍류를 자세히 조사할 수 있었다. 황화익씨 집에도 악기가 대 여섯 종류가 있었다고 한다. 황화익씨가 계를 치루면 보름간 진행되기도 하였다. 황오익씨 는 점점 가세가 기울어 가난해지고, 황화익씨는 흥덕에서 알부자였다. 황화익씨 댁에서 계 원들이 매일 연주회를 하거나 연습을 하였다. 계를 하고자 당시 주변의 광대들이 20여일 치 의 살림살이를 지게에 지고 오는 것이 다반사였다. 이곳에 오면 먹고 재워주웠기 때문이었 다. 심할 때는 이곳에서 한 달간이나 계속하여 계가 열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한국 전쟁 직후까지 계속했었다. 이기화원장은 처 외숙 때문에 이러한 기초조사를 할 수 있었다 고 한다. 육이계는 성내의 삼구회(三九會)와 흥덕의 아양율계(蛾洋律契)가 해산되고 난 이후 한동안 공백기를 거쳐 1961년 3월 15일 결성하였다. 육이계는 황이재가에서 만들어 정읍과 고창의 사람들이 모였다. 이 계의 총무가 바로 황화익씨였다. 신쾌동씨는 1910년에 출생하였으며, 50-60년대에 완숙한 경지에 이르렀다. 그는 가난을 피하여 이곳에 거주하게 된 것이다.
황화익씨는 편종도 가지고 있었다. 편종은 가격이 비싸 아무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다. 편종은 반드시 군에서 인수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의 집에는 서너 벌의 거문고와 몇 벌의 가야금이 있다. 당시 가난한 시기라 육이계에 서로 가입하고자 하였다. 화익씨는 재무 를 보면서 선별하여 가입을 시켰다. 이 계에는 정읍인들이 많이 가입하였다. 그리고 흥덕, 성내, 줄포 등의 근동에서도 많이 모였다. 흥덕현의 이러한 정서 때문에 김창록이 흥덕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석전 황욱(黃旭, 1897년 생)씨는 화익씨댁에서 살았다. 그는 글씨를 써서 정읍장에 내다 팔 아 생계를 유지하였다. 그는 양금을 칠 줄 알았으며, 기타 간단한 악기를 다룰 줄 알았다. 석전은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 계원들 빠질 경우 그가 간단하게나마 대역을 해주곤 하였다. 성내의 황씨들이 아니었으면 흥덕이 풍류와 예술의 고장이 안 되었을 것이다. 이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재는 성내에 전염병이 돌자 정읍 칠보의 처가댁으로 갔다가 돌아와 다 시 새터에 집을 지어 사셨다. 전염병이 돌았던 집에 다시 사시는 것이 꺼림직 하여 지금의 집을 지은 것이다. 황오익씨가 집안을 맡으면서 가세가 점점 기우러진 것이다. 그러나 황씨 댁에는 귀중한 물건이 많이 있다. 임석재는 고창 월곡출신으로 그와 대화한 기록테이프가 있다. 임석재씨의 조카가 고창교육 청의 학무과장을 했다. 그가 강한영교수가 왔을 때 녹취를 한 것이다. 월곡에 사는 임씨들 후손이 있다. 임달종(월곡의 임정빈 교장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지)이 사법사서 로 고창에 입향을 하였다. 임달종씨가 그의 아들을 고창고보에 입학을 시키기 위해 고창에 입향한 것이다. 그리고 그의 자식들은 모두 고창고보를 나왔다. 고창고보 때문에 1930년대 고창이 여타지역보다 문물이 앞서게 된 것이다. 김창록은 동편제의 창법으로 수준이 높았다. 그는 당시 명창이었던 박만순과 김세종과 어깨 를 나란히 할 정도로 대등한 솜씨를 가졌다. 그는 흥덕에서 실력을 향상했으며, 특히 심청 가에 능했다. 그는 심청가에서는 독보적인 존재였다. 창록은 소리가 좋아 심청가를 부르면 관객들이 울었다고 한다. 그의 목소리를 수리성이라 하는데, 이는 목소리가 막걸리를 먹고 쉰 듯 컬컬한 것을 말한다. 판소리는 수리성을 지녀야 잘한다고 하고, 오랫동안 창을 한다 고 한다. 창록은 심청가의 명부로 소문이 났다. 그는 창의력을 발휘하여 팔도담배가를 춘향 가에 끼워 넣어 불렀다. 그는 팔도담배를 써는 이야기부터 맛까지 비교해서 부른 노래이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전하지 않는다. 그는 김소월의 산유화가를 작곡하여 노래를 불렀는데, 너무 슬퍼 청중들이 너무 울었기 때문에 노년에는 부르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노학성(老鶴 聲)의 소리를 가졌다. 판소리 명창들이 작곡하여 자신의 장기로 부르는 대목을 더늠이라 한 다. 오늘날 판소리의 구조와 법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고 있으며, 거의 고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변화시키거나 개작할 수 없다. 더늠은 신재효의 광대가에 잘 소 개하고 있다. 허금파(許錦波)의 손자가 지금 고창에 살고 있는 송상기이다. 허금파의 딸인 송어령(송월향)
은 노래를 아주 잘했으며, 버선 춤이 일품이었다. 특히 송어령은 학춤을 기막히게 추었다. 허금파는 부안면 사창에서 살았다가 읍내로 나왔다. 허금파는 진채선, 강소천 등과 함께 여 성광대의 비조라 불렀다. 허금파는 경북 대구사람으로 어렸을 때 고창으로 와서 신재효의 문하에 들어왔다. 허금파는 아마 대구에서 송상기할아버지를 만나 여기로 온 것 같다. 송어령이 학춤을 추면 버선이 하나도 지저분하지 않을 정도로 사뿐사뿐 춤을 추었다. 송어 령의 오빠는 인력거를 하였는데, 고창사람들이 그의 인력거를 많이 이용해 주었다. 허금파 의 아들과 딸도 창을 잘했다. 송어령의 오빠는 고창의 마지막 인력거꾼이었다. 그가 하던 곳은 서부리(지금의 고창읍 읍내리 전 인제약국자리) 인력거 집이었다. 허금파는 사창에서 나와 읍내에 살았다. 허금파가 남편에게 매료되어 서부리(서흥동)에 살았다. 지금도 집터가 남아 있다.(키다리신집 뒤) 허금파의 손자인 송상기씨(전 복싱체육관 관장으로 그의 제자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 획득)가 살아 있다. 그의 할아버지의 이름도 확인해야할 사항이다. 송상기씨에 의하면 큰 딸 이 송향란(宋香蘭)으로 대구에서는 유명한 명창이라고 한다. 그의 제자로 현재 이옥천(李玉 千) 명창이 활동을 하고 있다. 허금파의 묘도 송상기씨는 잘 알고 있다. 허금파는 어려서 김세종(金世宗)문하에서 판소리 를 공부하여 진채선(陳彩仙)에 이어 여자 판소리 명창의 선구자가 되었다. 뒤에는 신재효(申 在孝)로부터 판소리의 지도를 받아 대명창이 되어 고종 때 크게 이름을 떨쳤다. 1900년 광 무대(光武臺) 협률사(協律社)공연에 참가하였고, 1903년 원각사(圓覺社) 창극공연에 참가하 여〈춘향전〉에서 월매역을 하였다 한다. 원각사 공연 이후에는 가정에 묻혀 살았다.〈춘향가〉를 잘 불렀고, 특히〈춘향가〉가운데 ‘옥중상봉’ 대목이 더늠(장기)이라 한다. 김세종의 소리제를 이어받았고 신재효로부터 이론 적 지도를 받은 만큼 매우 품위 있는 소리를 한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내용은 전하지 않는 다.
[참고문헌]
朝鮮唱劇史(鄭魯湜,
朝鮮日報社,
1940),
唱劇史硏究(朴晃,
白鹿出版社,
1976) 김수영 김찬업 부자 김수영(金壽永)은 고창군 성내면 옥제리 3구 출생이다. 그는 박만순과 동갑이며, 수긍가가 그의 더늠이다. 그는 박만순이가 김수영을 중매하였는데, 박만순의 제자인 오끝춘의 여동생 과 결혼을 하였다. 오끝춘은 순천사람으로 박만순 제자다. 오끝춘이 바로 김수영의 아들 감 찬업의 외사촌이 된다. 김수영은 동편제 수긍가를 잘했다. 김수영보다는 그의 아들 김찬업 이 더 뛰어났다. 오끝춘이 그의 생질인 김찬업을 가르쳤다. 김수영은 헌철고(憲哲高) 3대간 인물이다. 박만순, 이날치 동배로서 대가로 칭할 것은 없었 으나 서편의 요령을 잃지 아니하고 중모리는 특수하게 잘하였으며 토별가에 장하였다. 60여 세에 사(死)하였다. 토별가 중 그 특장처를 들면 여좌(如左)하다. “자라는 앞에서 앙금앙금, 토끼난 뒤에서 조잠조잠, 이리저리 살살 돌아 수작하며 가노라 니 ...(중략)... 경망한 저 토끼가 단참에 고지(곧이) 듣고 여우다러 욕을 하며, ‘그놈의 평생 행세 사사이 저러 하제. 열 놈이 백 말 해도 나는 따라갈 테이요.’ 그렁저렁 나려가니 해변 당도하였구나.” 운운.(고전을 신재효가 윤색한 것이다.) 참고: 네이버 서편제로 이름을 떨친 명창으로 중모리를 잘하였다 한다.〈수궁가〉를 잘 불렀고, 특히 ‘토
끼가 자라 따라 수궁가는 대목’을 잘 불렀다. 김찬업(金贊業)은 명창 김수영의 아들이다. 그는 조선 고종 때 활약한 판소리 명창으로. 전 라북도 흥덕(興德)현 성내 출생이다. 처음에는 박만순(朴萬順)의 제자이자 외삼촌인 오끝춘 에게 배웠다. 그리고 박만순과 김세종(金世宗)으로부터 판소리를 배워서 이름을 떨쳤다. 김 세종의 영향으로 이론에 밝았고, 정창업(丁昌業) 등 당시 명창들의 소리평을 적절히 하였다 한다. 찬업은 대원군의 총애를 받아 장안에서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그는 장안을 집중시킨 국창으로 불렸으며,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졌다. 그가 판소리를 할 때 호랑이의 어흥 하는 소리를 내었다. 그러면서 청중들을 제압하는 뛰어 난 능력이 있었다. 그는 홍종의 소리를 천부적으로 타고 났다고 한다. 호랑이 소리를 한다 고 해서 홍종성이라 하였다. 그의 특장은 춘향가이며, 대목으로는 토끼화상을 묘사 잘했다 고 한다. 찬업의 더늠은 송강찰(송만암)과 전도성, 신명학 등이 와서 배울 정도였다. 그는 말년에 성대가 고장나 소리를 못하게 되어 제자를 못 길렀다. 더늠 제자만 있고, 후손은 확 인이 안 되고 있다. 찬업은 동편제(東便制)전통의 고상한 판소리를 하여 이면(裏面)을 깊이 아는 소리꾼으로 꼽 혔을 뿐만 아니라 흥선대원군의 아낌을 받기도 했으나, 만년에는 목소리가 상하여 소리를 폐하고 말았다. 눈빛이 빛나고 목소리가 종소리와 같이 커서 별명이 ‘호랑이’였다. 그의 〈춘향가〉는 김세종에게서 이어받아 정응민(鄭應珉)을 통하여 정권진(鄭權鎭)에게 전승되었 는데, 소리의 성음이 분명하고 구성이 정교한 특색을 가지고 있다. 〈춘향가〉를 특히 잘하 였고, 더늠으로는〈수궁가〉에서 ‘토끼 화상을 그리는 대목’인데 스승 박만순의 소리제라 한 다.[참고문헌] 朝鮮唱劇史(鄭魯湜, 朝鮮日報社出版部, 1940), 판소리小史(朴晃, 新丘文化社, 1974) 신만엽(申萬葉)씨는 신쾌동씨와 고향이 익산 여산출신이다. 그는 1850년에 출생하여 1910 년에 졸하였다. 그는 후기 8명창의 한 명으로, 어려서 고창에 와서 창을 배워 성공하였다. 신만엽은 무장에서 거문고와 판소리 사범을 하면서 판소리를 배웠다. 그는 황씨의 광대촌에 서 살면서 생업의 터전으로는 무장에서, 공부는 고창 신재효 문하에서 하였다. 신만엽씨의 특장은 수긍가이다. 김여란(金如蘭)은 심원 고전포 태생이다. 그의 본명은 분칠이로 여란은 예명이다. 그녀는 고 전포에서 활동을 하다가 구동에 살았다. 그리고 남편을 따라 성내면 신성리 구동마을로 이 사를 오게 되었다. 그녀는 1907년 생으로 1965년 김소희씨가 박정희대통령으로부터 인간 문화재로 지정을 받을 때, 김소희씨가 김여란씨도 추천하여 함께 인간문화재가 되었다. 김 여란은 황씨의 광대촌을 다니며, 그곳에서 판소리를 다듬었다. 그녀는 한문 실력도 좋은 지 식인이었다. 이런 김여란을 김소희는 언니로 섬겼다. 인간문화재 지정 당시 김소희와 김여 란은 최초로 예능보유자로 지정이 되었다. 당시 다섯 명의 예능보유자 중 고창사람이 두 명 이나 되었다. 김여란은 동편제의 춘향가를 잘하여 동편제로 지정을 받았고, 김소희는 서편제로 인간문화 재로 지정을 받았다. 당시 동편제나 서편제는 지역적 가름이 아니라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 에 따라 달라진 것이다. 즉 고창지역이 서편제이긴 하지만 동편제를 하는 사람에게 배웠으
니 동편제를 하게 된 것이다. 김여란은 정정열의 제자다. 정정열씨가 동편제를 했고, 정정열씨로부터 적벽가를 베웠다. 당 대에 적벽가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바로 김여란이다. 명창 최승희가 김여란의 제자이다. 김 소희는 제자가 없는 것이 특이하다. 김소희 제자로 안향년이라는 노래를 잘하는 있었으나 자살하였다. 정식제자는 없지만 대구에서 활동하는 이명희가 있다. 그녀는 전주대사습놀이 에서 판소리대상을 받았다. 그는 전라도 사람이지만 대구에서 학원을 하면서 활동하고 있 다. 그리고 안숙선씨가 있다. 그녀 또한 정식제자는 아니지만 여성마당의 일부를 만정에게 배웠다. 그래서 이들도 제자라 할 수 있다. 김남수(金南洙)는 고창 흥덕태생으로 서정주시인이 명인으로 추천한 사람이다. 전북일보 자 료실에 있으며, 그는 흥덕 읍내 태생이다. 그는 풍류의 굿거리와 다스림에 능하였다. 특히 판소리의 서편제는 명창급이었다. 본관은 김해 김씨로 당시 광대나 당골들은 갈 곳이 없으 면 모두 김해 김씨라 했다. 김소희의 태생은 고창군 흥덕면 흥덕리로 흥덕중학교의 바로 앞의 길을 따라 시내 방향의 우물이 하나 있다. 그 우물 앞에서 왼쪽으로 난 골목길의 마지막 집이다. 지금도 그 집 앞 에는 할머니 한 분이 살고 있다. 그 분이 김유성(고창군 건설과 과장)씨의 큰 누나다. 김할 머니가 살고 계시는 바로 앞이 만정의 생가다. 지금은 집터만 남아 있다. 만정은 흥덕초등학교 1기생을 학교를 다녔다. 이기화원장은 생전에 만정에게 고창에 묘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지금 고창 화산에 그녀의 묘를 쓰게 된 것이다. 박우형씨의 아버지인 박동차씨(도의원을 지냄) 때문에 만정이 고창에 오려하지 않았다. 박 동차씨와 만정의 썸싱이 있었기 때문이다. 1965년 고창 모양성제를 할 때 이기화원장이 군 수에게 말해 만정을 모셔오기로 하였다. 만정이 고창에 오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모셔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기화원장은 구근혁씨와 박동차씨를 찾아가 만정을 구제해달라고 말했 다.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묻길래, 과거의 좋지 않은 일들을 잊도록 성심성의 껏 뭔가를 준비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박동차씨는 깨기름을 어마어마하게 짜주셨다. 아마 100병은 넘었던 것 같다. 그리고 구근혁씨는 곰소에서 만정이 좋아하는 젓갈을 사서 만정 에게 주었다. 한편으로는 군수와 관내 유지들을 모아 조양관 2층에 만정을 위한 만찬을 준 비하게 했다. 이렇게 만정의 체면을 살려주고 그녀를 모셔왔다. 만정에게 열차표를 끊어 주고 정읍역으로 오라 했다. 그리고 군수차로 그녀를 고창으로 모시고 온 것이다. 만정을 모시고 조양관 2층 으로 가자 모든 고창의 유지들이 만정을 열렬히 환영하여 만정이 흡족해 했다. 그리고 군수 는 그녀에게 금반지를 선물로 주었다. 모양성제 당일 만정에게 환영사를 부탁했고, 그녀에 게 한 시간 동안 마음대로 진행해보라고 하였다. 그때는 문화원에서 모양성제를 주관하고 있을 때였다. 만정은 고향에서 환대 후 고창에서 준비한 물건들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 국 악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만정의 이야기를 들은 남원의 인간문화재 박상하씨는 남원문화원에 쓴 소리를 했다고 한다. “고창은 싹수가 있어서 고창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기화원장은 박동차씨에게 찾아가 만정이 죽을 때 그녀의 묘를 고창에 쓰기 위해 돈을 내
놓으라고 했다. 그러자 박동차씨는 그럼 내가 반을 내놓을 터이니 반은 원장이 부담하라고 하자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땅 값으로 총 600만원이 들어가는데, 300만원을 박동차씨가 내 놓은 것이다. 당시 판소리동리대상시상식이 제정이 되어 1회 수상자로 만정이 선정되었 다. 만정은 상금으로 일천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기화원장이 그녀에게 만정이 들어갈 집을 지으려 하니 상금에서 300만원 내놓으라고 해서 지금의 화산 땅을 매입해서 묘를 쓰게 된 것이다. 그 밭이 바로 박동차의 밭이었다. 그 후 안숙선과 신영희(申永喜)씨에게 연락해 기 일이면 꼭 만정의 묘를 방문하도록 요청하여 오게 된 것이다. 만정의 딸이 지금 전남대학교의 국문과 교수로 있다. 그녀는 아마 서울에 사는 만정의 애인 에게 받은 씨로 낳은 딸이다. 아들도 있었는데, 별 볼일 없었다. 김소희씨가 사는 집은 한 건축가가 지어 주었다. 그래서 아마 만정의 애인이 그 건축가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알 고 보니 만정이 그와 딸을 묶어 주었다. 김소희씨 기념관을 만들어야 한다. 김소희씨의 자 료는 그녀의 딸이 가지고 있다. 농부터 다 가지고 있다. 박녹주도 만정과 같이 인간문화재 이다. 그러나 경북 구미출신의 박녹주는 비 하나 없다. 만정의 태생지에 대한 문제는 반드 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녀는 흥덕읍내 출신이 맞다. 사포는 그녀의 어머니가 그곳에서 당골을 하면서 살던 곳이다. 주말에나 가서 어머니를 만나고 온 곳이다. 김소희시와 함께 그녀의 제적부를 떼어서 보았다. 그리고 그 제적부를 김상중 시인에게 보 여주고, 그에게 주었다. 호적에 분명히 흥덕 읍내라고 나오는 왜 사포냐? 이호종씨가 당시 사포에 생가를 만들었다. 김소희씨의 아버지 김상호씨는 읍내에 살았다. 김상중씨 집안에 제적등본을 주었다. 그리고 만정도 인정을 했다. 그런데 왜 사포로 역사를 왜곡하느냐? 이 것이 관제문화다. 1996년 8월 나는 문화원장을 내 친구에게 내 놓았다. 동창생인 친구가 맡다가 다시 2001년에 문화원장이 되었다. 이호종씨가 흥덕 사포에 가서 만정이 사포에서 태어났냐고 물었다.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 오가는 만정을 보았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사포 사람들이 그곳에서 태어났다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민들의 말만 믿고 집터를 결정해 생 가를 복원한 것이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만정의 어머니는 법성포에서 당골을 사가지고 사포 당골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상 호씨와 결혼을 했다. 김상호씨는 만정을 흥덕소학교에 보내기 위해 읍내에 거주하였고, 어 머니는 사포 당골에 살았다. 주말이 되면 만정은 어머니를 보고자 사포를 왕래했다. 지금 만정의 집은 터가 남아 있다. 호적과 제적부에 나온다. 만정이랑 함께 확인했다. 이는 흥덕 에 사는 김상중씨가 입증을 한다. 만정의 딸은 사포를 안 간다. 그녀의 할머니가 당골이라 는 것이 창피해서 안 간다. 만정의 동생인 김경희(金慶姬, 1920년생)도 언니에 묻혀서 그렇지 명창으로 유명한 사람이 다. 김경홍(金景弘)은 상하출신으로 당대 유명한 명창이다. 김토산(金兎山)은 흥덕 사포태생으로 1870년에 태어나 1953년에 졸하였다. 본명은 김경종 이다. 그가 이 시대 마지막 광대라 할 수 있다. 국악명인사전에 나온다. 김성수(金成洙)는 자신의 태생을 사포라 했다가 사등리라 했다. 그러나 그는 원래 법성에서
태어나 사포로 이주를 했다. 사포로 와서 김토산의 제자가 되었다. 윤석기는 해리태생이다. 그는 1932년에 태어나 지금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다. 공대일(공옥 진의 아버지)의 제자이다. 그는 공대일에게 춘향가를 사사받았다. 김연수는 심청가와 수긍가를 잘했다. 그리고 박봉순에게 적벽가를 배웠다. 이것이 고창광대 들의 계보다. 참고로 편재준(片在俊)이 있다. 그는 1983년 65세의 일기로 사망하였다. 원래 봉사였는데, 대금을 잘 불었다. 만정이 인정한 당시 최고의 기악가다. 그는 사포에서 살았다. 기악을 잘 했으나 녹취는 하지 못했다. 김태생은 고종초기 사람으로 후포에 살았다. 그도 기악인으로 13살에 송만갑의 문하에 들어 갔다. 그가 명창대회에서 장원을 하자 송만갑이 그의 천재성을 읽고, 그를 광주수피아여고 에 다니게 한 것이다.
황화익씨 집안의 편종 군에서 인수. 허금파의 묘를 확인(손자 송상기씨) 허금파는 대구사람이라 하나 다른 기록은 김천으로 되어 있음. 허금파가 살았던 집 확인 허금파의 남편이름 확인 판소리와 관련된 사람들의 묘나 생가 및 고택을 확인 후 안내판 설치 만정 김소희의 생가는 사포인가? 흥덕인가? 동학혁명 무장읍성은 무혈이 아니라 유혈이 맞다. (동학농민운동 봉기, 한우근, 1976, 세종대왕기념사업회, p.175)